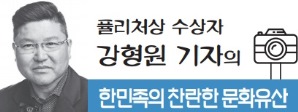▶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
▶ (54) 제례(祭禮)문화

추석날 아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표선공설묘지에서 차례를 지내는 모습.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의 토착 성씨인 제주 양씨 집안의 성주공파 30세손 양종훈 상명대 교수가 명절을 맞아 제단에 잔을 올리고 배래한 후 조상이 아닌 토신에게 걸명(고수레) 을 하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올해 77세의 임오남 할머니는 육지로 시집간 딸 셋과 자녀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간 아들 없이 혼자 27년 전 작고한 남편 묘지를 제삿날 방문해서 술 한 잔 따라드리다가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성읍 마을에 제일 먼저 정착한 김해 김씨 입향조(入鄕祖) 김성중 할아버지 이후로 14대 째 같은 집터에서 살고 있는 종갓집에서 종손 김명호씨가 추석날 아침 할아버지 내외분과 부모님 차례를 준비한 뒤 절을 드리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성읍 마을 김해 김씨 14대 종갓집의 추석 차례상. 우리 조상이 만든 첫 표어문자인 한자의 조상 조(祖) 자에서 왼쪽 보일 시(示) 글자는 추석 차례상에 올라온 긴다리의 제기의 모양의 갑골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제주의 송편은 보름달 모양의 둥글고 가운데가 오목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 성읍마을에서 김해 김씨 14대 종손 김명호씨가 추석 아침 차례상에 놓을 송편을 제기에 담고 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남자만 진설하는 풍습을 따르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김해 김씨 종갓집에서 추석 아침 차례를 지낸 후 참석한 후손들이 모여 앉아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신의 뜻이 담긴 술과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을 할 준비하고 있다. 종갓집 며느리 이미향씨와 큰딸 김정효씨가 14대 종손 김명호씨에게 국과 밥을 나르고 있다. 음복 차림상 앞에 앉은 친척은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3대 김상찬 다섯째 작은아버지, 14대 사촌 김홍관, 13대 넷째 작은 아버지 김봉찬, 14대 사촌 김홍선. [Photo ⓒ 2021 Hyungwon Kang]
우리 문화가 다른 고대 문명들과 차별화되는 풍습 중에는 조상을 추모하는 오랜 전통이 체계화된 제례(祭禮) 문화가 있다. 우리 제례문화의 기원은 동아시아 문명의 시발점에서부터 나타난다.
우리 조상이 만든 첫 표어문자인 한자의 조상 조(祖) 자에서 왼쪽 示는 제단이나 신주를 뜻하고, 오른쪽 且은 제사지낼 제물을 종류별로 세 칸에 나눠 담는 제사 음식 그릇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중국 문헌 속의 한국 역사를 연구한 이기훈 작가는 “오늘날 제사 문화가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인 은나라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며 “은나라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천년간 이어온 이 전통은 조상을 받들고 추모하며 자손들의 우애와 단합을 도모하는 의식으로, 조상 숭배를 초월해서 유교가 정착된 조선(후조선) 시대부터는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인성교육을 완성시키는 핵심 가치관으로 존재해왔다.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을 애초부터 거부했던 귀족들과 반대 세력들이 고려 때 이주해온 역사가 있는 제주에서는 본토와는 다른 독특한 섬 문화에서 자생된 오랜 유교적인 제사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이성계를 반대한 귀족들이 제주도에 귀양 와서 유교문화를 전파시켰다”고 제주 성읍(濟州 城邑) 마을 김상찬박사 말한다. 제주에서는 토착 성씨인 고•부•양씨를 제외한 모든 성씨는 그 집안에서 최초로 섬에 정착한 시조인 입도조(入島祖)가 있다.
고려 때 김해 김씨의 입도조 김만희 할아버지 이후 제주 성읍 마을에 제일 먼저 정착한 김해 김씨 조상 입향조(入鄕祖) 김성중 할아버지의 14대손 김명호씨 종갓집에서는 추석 아침에 어김없이 할아버지 내외분과 부모님 차례를 모신다.
제례문화에서 제사는 밤에 지내고, 추석이나 설 명절 차례는 낮에 지낸다. 우리 문화에서는 지역에 따라, 또 집안마다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전통과 풍습이 조금씩 다르다.
차례상 진설은 남자가 하며, 지키는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어동육서(魚東肉西), 바닷고기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색 과일은 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조율이시(棗栗梨枾), 과일은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로 놓는다.
육지와 달리 기후가 유난히 척박한 제주섬에서는 전통적으로 육지에는 있지만 제주에는 없는 대추나 감 같은 과일은 차례상에 오르지 않는 대신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음식으로 제수를 올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술빵으로 불리는 상외떡이나 메밀로 빚은 빙떡이 있다.
“제주는 바람이 세어 대추가 안 열리고, 감도 홍시가 없었다. 대신 귤 같은 철 과일을 올린다”고 김상찬 박사는 설명했다. 제주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고사리는 항상 제사상에 올라왔지만, 콩나물도 귀할 때는 없어 호박나물로 대체했다고 한다. 제주인이 즐겨 먹는 쉰다리는 집에서 담근 제주 전통 발효음료로 차례상 술잔에 부어 올린다.
요즘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가족의 성별을 굳이 따지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떡이나 묵은 여자들이 만들고, 생선이나 산적을 굽는 일은 남자들이 준비를 했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제사상에 올리는 최고의 제수로 “생선 중의 참 생선”이라 불리는 옥돔이 빠지지 않는다. 육지에서 보편적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조기는 제주에서 많이 잡혀 육지로 나가지만 제주 사람들은 “그 흔한 조기는 생선으로 치지 않는다”고 김상찬 박사는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제주에서는 머스크 멜론(캔탈롭 cantaloupe)을 비롯한 열대과일이 재배돼 제주 차례상에 가끔 오르기도 한다. “제사 때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차려드리고 명절 때는 좀 간소하게 준비합니다.” 김해 김씨 14대 종갓집 며느리 이미향씨의 말이다.
예년 같으면 각자 직계 부모님 차례를 지내고 30~40명의 친척들이 14대째 제주 성읍 마을 같은 집터에서 살고 있는 김해김씨 종갓집에 오후 1~2시에 모여서 차례를 지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예전처럼 모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빠른 속도로 ‘개화’를 해온 한국에서 제사를 모시지 않는 신세대가 늘고있는데, 일부 간소화된 제례풍습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고유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으로 생활이 전환되고, 또 디지털 시대로 변화를 거치면서 민속 전통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조상 조(祖) 자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제례문화의 소중한 정신이 반영된 문화와 풍습이 미래 세대가 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으로 계승되도록 보여주면서 실행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우리·문화·역사 Visual History & Culture of Korea 전체 프로젝트 모음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ang.org/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