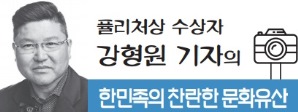▶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
▶ (42) 대가야(大加耶) <상>

송곳니가 있어 영어로는 뱀파이어 사슴(Vampire deer)으로 불리는 고라니 한 마리가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제5호분(1978년 정비) 위로 날아가듯이 넘어가고 있다. 사진 속의 고라니 순간포착 장면이 흡사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에 나오는 사슴의 모습을 닮았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는 700기 이상의 확인된 고분이 서기 400년에서 대가야가 신라에 562년 흡수 멸망할 때까지 모여 있다.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온 우리 고분의 도굴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해 수로왕릉 사적 제73호. [Photo ⓒ 2021 Hyungwon Kang]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 대형 고분 44호분 순장 덧널무덤을 재연 해 놓았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사적 제79호에 있는 대형 고분마다 순장덧널(순장석곽 殉葬石槨)이 수십개씩 있는데, 지산동 44호분의 경우 대략 40여명에 이르는 사람이 순장된 것으로 여겨지며,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남녀가 확인되었고, 부부, 자매, 부녀가 함께 순장되는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반영되었는데, 역할도 호위무사, 창고지기, 시녀, 마부, 일반백성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 한다. 순장은 이승의 삶이 저승에서도 이어진다는 계세(繼世) 사상에 의거한 장례 풍습인데, 다른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아직 이러한 대규모의 순장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는 가야의 특별한 토기 대표작들인 국보 제91호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가 240cc 정도 술이나 물을 따르는 데 쓰던 주자(注子) 병이라면, 국보 제275호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陶器騎馬人物形角杯) (오른쪽) 은 술을 받는 잔이다. 두 토기에 등장하는 말은 죽은 이를 하늘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에 입각하여 그당시 기마문화를 보여주며, 인간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말 전신을 철기 갑옷으로 감싸고, 목과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시 착용하는 갑옷 경갑(頸甲)을 입은 모습은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경갑과 비슷한 형식의 작품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지산동 고분군 44호분 순장 덧널무덤에서 발굴된 가야시대 다양한 토기들.
[Photo ⓒ 2021 Hyungwon Kang]

신석기시대 때부터 한반도에서 발전해온 토기 가운데 가장 조형미가 뛰어나며 곡선이 아름다운 가야토기(加耶土器)를 통해 우리 민족의 예술적인 표현을 잘 드러냈다. 경남 김해 대성동 에서 1992년 발굴된 4-5세기경 가야 토기. [Photo ⓒ 2021 Hyungwon Kang]

김해 여래리에서 2012년 발굴된 가야 4-5세기 그릇받침. 가야토기는 신라 토기에 비해서 날렵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삼각구멍 무늬잔. 경남 합천 저포리, 1988년 발굴, 삼국시대(가야) 5~6세기.
[Photo ⓒ 2021 Hyungwon Kang]

사슴이 붙은 구멍단지는 제사나 각종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가야금 토우. 가야금은 가야왕국에서 발명된 악기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관장은 대가야의 대부분 고분들은 도굴의 피해를 본 고분들이라고 말한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고령 출신의 고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용호씨는 70년대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에는 토기를 가져오는 것이 숙제였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것은 가져가고 깨진 유물은 학교에 전시해 놓고, 아이들은 돌로 가야유물을 깨서 부수는 ‘부석치기’ 놀이를 했다고 전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서기 42년부터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 중심에서 500여년 이상 화려한 문화를 창조했던 가야는 삼국시대의 4번째 국가로, 정확하게는 가야연맹체였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신라, 서쪽으로는 백제에 흡수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국 중 첫 번째로 가야국이 없어질 때, 역사책에서는 대가야(大加倻)가 멸망했다고 기록했다. (삼국사기 加耶, 삼국유사 伽耶로 기록됨.)
역사 기록에는 가야(伽耶)를 가라 (加羅), 가락(駕洛), 임나(任那), 대가야국(大加倻國), 반파국(伴跛國)으로, 그리고 광개토왕릉비에는 임나가라(任那加羅)라고도 새겨져 있다.
삼국시대 4번째 국가였던 가야연맹은 신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에서 만들어 온 토기 가운데 가장 조형미가 뛰어나 며 곡선이 아름다운 가야토기(加耶土器)를 통해 우리 민족의 예술적인 걸작을 많이 만들어냈다.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무장된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서 500년 이상 독자적이고 화려한 문화를 유지 했던 가야는 가야토기 이외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전략물자인 소금과 철 중에 철을 주력물자로 생산한 그 시대의 최첨단 산업의 주인공이었다.
가야의 철기문화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왕의 저승궁전인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야무사의 상징인 큰 철판 20~30매를 이어서 만든 판갑(板甲, 철판 갑옷)과 고구려 양식의 찰갑(札甲, 비늘갑옷)이 있다. 고대 판갑 갑옷은 철판의 유동성이 부족 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여주는 조그만 철판을 여러 장으로 엮어서 만든 북방계 기마전사들이 입던 찰갑(札甲) 갑옷은 가야 후기에 진화된 것으로, 뛰어난 제철기술을 성취한 가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판갑(板甲) 갑옷이 일본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고대 가야문명의 제철기술이 일본열도까지 일찍이 전해졌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야토기는 가까운 바다 건너 일본 열도의 고대 스에키(須惠器) 토기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7마일(76km) 밖에 안 되고,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는 132마일(213km) 거리여서 일본과 가야의 역사는 20세기에 또 만난다.
가야고분에서는 고대 고조선, 부여, 고구려를 이어 계승한 순장(殉葬) 문화가 발견되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사적 제79호에 있는 대형 고분마다 순장덧널(순장석곽 殉葬石槨)이 수십 개씩 있는데, 대가야박물관의 정동락 관장은 "지배자가 사망했을 때 왕의 저승 궁전에서 필요한 사람, 지산동 44호분의 경우 대략 40여명에 이르는 사람이 순장된 것으로 여겨지며,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남녀가 확인되었고, 부부, 자매, 부녀가 함께 순장되는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반영되었는데, 역할도 호위무사, 창고지기, 시녀, 마부, 일반백성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장은 이승의 삶이 저승에서도 이어진다는 계세(繼世)사상에 의거한 장례풍습인데, 다른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아직 이러한 대규모의 순장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무덤 안에는 주인공이 평소에 사용하거나 저승생활에 필요한 각종 껴묻거리를 넣었는데, 껴묻거리는 크게, 토기, 무기, 말갖춤, 장신구, 축소모형철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들은 ‘대가야 양식’ 또는 ‘고령 양식’ 등으로 불리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특징을 지닌다. 정동락 관장은 "축소모형철기는 농기구나 공구를 원래 크기보다 축소하여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대가야의 특징적인 유물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이하고, 화려한 껴묻거리는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은 물론 우리 고대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소위 고분시대(古墳時代)를 3세기 중반부터 7세기 말로 정의해 놨는데,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서기 400년에서 대가야가 562년 멸망할 때까지 707기 이상의 확인된 고분이 모여 있다.
대가야박물관의 정동락 관장은 “대가야의 대부분 고분들은 도굴의 피해를 본 고분들”이라며 “1980년도에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돼 온 우리 고분에 대한 도굴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고분인지 아닌지는 도굴 흔적만이 아니고 주변 상황이나 봉분으로 보이는 외형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출신의 고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용호씨는 “70년대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에는 토기를 가져오는 것이 숙제였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것은 가져가고 깨진 유물은 학교에 전시해 놓고, 아이들은 가야유물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깨부수는 ‘부석치기’ 놀이를 했다”고 전했다.
고령 인근 예비군 부대에서 방위병들이 근무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중대장이 대가야 무덤을 파서 유물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하면, 고령 지산동 44호분(高靈 池山洞四十四號墳)이 있는 고령군 주산(主山)의 남쪽 능선상에는 대규모 고분군이 많은데, 1960년대 말에는 무덤들을 도굴하는 도굴꾼들이 산아래 동네에서 하숙을 했으며 “저녁 먹고 나면 전부다 불써가지고 야간에 도굴 나갔다”고 지역 노인들이 전했다.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는 가야의 특별한 토기 대표작들인 국보 제91호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가 240cc 정도 술이나 물을 따르는 데 쓰 던 주자(注子) 병이라면, 국보 제275호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陶器騎馬人物形角杯)은 술을 받는 잔이다. 두 토기에 등장하는 말은 죽은 이를 하늘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에 입각한 그 당시 기마문화전통을 보여주며, 인간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말의 전신을 철기갑옷으로 감싸고, 목과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시 착용하는 갑옷 경갑(頸甲)을 입힌 모습은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경갑과 비슷한 형식의 작품이다.
대가야 고분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 산위에 올라가면 석산이 없는데도 석실을 덮은 넓고 큰 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의문이고, 73호분을 발굴했을 때 1,500톤 양의 흙이 덮여 있었는데 높은 산 위까지 그 많은 흙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운반해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고분을 보면 고대 가야의 판축기법, 노동력, 군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고대시대의 가장 오래된 장거리 통신수단이었던 봉화 유적이 대가야가 멸망한 경북 고령 주변보다는 백두대간 서쪽에서 최근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주 백두대간 서쪽 가야 이야기 계속>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우리·문화·역사 Visual History & Culture of Korea 전체 프로젝트 모음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ang.org/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