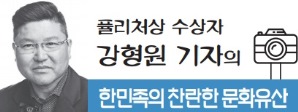▶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 (36) 삼별초 (하)
▶ 몽골서 온 말과 제주토종마 섞여… ‘잡종강세’ 결과 우수한 제주마로

동복환해장성(東福環海長城)은 삼별초가 몽골항쟁 때 제주도의 해안선을 따라 쌓아 놓은 돌성벽이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다. 제주도기념물 제49호. [Photo ⓒ 2021 Hyungwon Kang]

[Photo ⓒ 2021 Hyungwon Kang]

[Photo ⓒ 2021 Hyungwon Kang]

삼별초 몽골항쟁 때 쌓아 놓은 동복환해장성(東福環海長城)의 모습. [Photo ⓒ 2021 Hyungwon Kang]

신산환해장성(新山環海長城)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고려시대의 환해장성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항파두리 토성밖 멀리 한라산이 보인다.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에 의해 1271년에 진도가 함락되면서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나머지 삼별초병력을 탐라국(耽羅國)로 옮겨 항파두리 군사요새를 건축하며 계속 대항하였다. 항파두리 토성의 길이는 6km가 되고 성위에서 군사들과 군마들이 다녀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도록 과학적인 공법을 사용해서 바깥으로부터 방어가 되게 만들어졌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대찰 수정사지(水精寺址)에 주춧돌들을 모아놓았다.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지방기념물 제29호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항파두리 성 중앙에 있는 건물(궁)터 뒤로 몽골군 대항해 최후를 맞이한 삼별초군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항몽순의비(抗蒙殉義碑)와 벚꽃이 보인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건물(궁)터 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Photo ⓒ 2021 Hyungwon Kang]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기와. 삼별초가 제주에 오기 전에는 제주 지역에 없던 어골문 문양의 기와장이 항파두리 성터에서는 발견된다. 제주 전통가옥에는 기와를 안올렸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항파두리 토성 사이로 트럭이 진입하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한라산 등산하다보면 산속에 돌담이 자주 나타난다. 한라산 중턱에 있는 말과 소를 풀어 키우면서 목장경계용도로 쌓은 잣성 또는 ‘작’이라고 불리는 돌담. [Photo ⓒ 2021 Hyungwon Kang]

최영(崔瑩) 장군과 제주 몽골족의 목호세력(牧胡勢力)이 제주 관할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인 1374년 최후의 결전지였던 서귀포시 앞바다에 자리 잡은 범섬. 최영 장군의 성공적인 몽골인 목호들 토벌로 100여 년 동안 제주를 지배했던 몽골군들이 없어졌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육성되고 있는 다양한 모색의 우수한 형질의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는 고려 충렬왕 2년(1276)에 몽고말 160마리가 들어와 제주토종마와 섞이면서 잡종강세를 가져온 결과물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에 의해 1271년에 진도가 함락되면서 배중손 장군이 전사하게 되자,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나머지 삼별초 병력을 탐라국(耽羅國)으로 옮겨 항파두리에 토성으로 군사진지를 건축하며 계속 대항하였다. 항파두리 토성의 길이는 6km가 되고 성위에서 군사들과 군마들이 다녀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도록 과학적인 공법을 사용해서 바깥으로부터 방어가 되게 만들어졌다.
1273년에 1만2,000여 명의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의 공격으로 항파두리성이 함락되고 삼별초 무사들은 탐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 우리 역사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탐라국을 제주(濟州)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 진도 용장산성 수막새 기와와 오키나와 우라소시(Urasoe city, Okinawa Prefecture)에서 출토된 수막새 기와가 흡사하다는 발견이 있었다. 제주에서 삼별초가 사라진 시기인 1273년 바로 직후, 기와가 없던 오키나와 섬에서 류큐왕국(琉球王)에 기와지붕으로 왕궁이 건축되었고 문명이 급속히 발전했다.
오키나와에서 삼별초가 제주에서 전멸한 해인 1273년 계유년이 적힌 ‘고려와장조(高麗瓦匠造) 계유년(癸酉年)’ 글씨가 기와에 구워진 고려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다. 고려시대 삼별초가 1273년(원종 14년)에 제주도에서 몽골군에 패한 직후 오키나와에서는 100여 개가 넘는 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고려시대와 삼국시대 성의 축조 방법인 고려의 기술로 성벽을 지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쌓았다.
인류 역사에 없는 전쟁 방식과 이긴 후에는 어김없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 방식으로 가는 곳마다 도시와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13세기 몽골의 기병부대는 지구력 강한 몽골 말을 타고 하루 평균 70마일의 초원을 가로지르던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기동력의 고도로 조직화된 군대였다. 참고로 20세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기갑부대 하루 이동거리는 평균 20마일 안팎이었다.
흔히 조랑말이라고 불리거나, 키가 작아서 과실나무 밑을 지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의 ‘과하마(果下馬)’ 또는 ‘토마(土馬)’라고도 불리는 제주토종말 제주마(濟州馬)가 있는 제주에서 삼별초 토벌 직후인 1273년 삼별초를 쫓아온 몽고군의 지배하에 지구력 강한 몽골말이 체계적으로 사육되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제주마문화연구소장 장덕지 박사에 의하면 오늘날의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는 몽골군의 제주도 주둔의 결과물로, “원나라에서 보내온 좋은 말 160필이 제주마와 섞이면서 잡종강세(hybrid vigor)가 일어나 제주에서 우수한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 잡종강세란 잡종이 생육·생존력·번식력 등에서 양친보다 우수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몽고군이 제주에서 말을 사육하면서 공마(貢馬) 부실을 이유로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달로화적(達魯花赤)으로 표기된 원나라 행정지휘자)를 제주에 배치해서 제주에서 생산된 명마(名馬)를 원나라로 공출해갔다.
몽골군이 제주도에 들어와 100년 동안 떠나지 않고 군림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다. 1374년 8월에 고려조정에서 보낸 최영(崔塋) 장군이 전함 314척에 2만 5,000여 명의 대군단을 앞장세워서 제주섬에서 목호의 난(牧胡의 亂)을 평정하면서 목호 (제주에서 말을 기르던 몽골인)들을 완전히 토벌할 때까지 삼별초가 없는 제주도에서 몽골인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제주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몽골군의 만행은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제주섬의 일상 언어에 아직도 남아 있다. 제주 애월읍 태생 양인정씨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여자아이들에게 화나셨을 때 “이 몽곳년아!”라는 제주에서 가장 험악한 욕을 하시던 것을 듣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우리·문화·역사 Visual History & Culture of Korea 전체 프로젝트 모음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ang.org/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