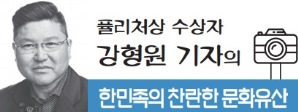▶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
▶ (34) 봄의 전령사 벚꽃

2016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발견한 한국 최고령 왕벚나무로 추정되는 한라산 자생 특산종 왕벚나무가 보안상 비밀에 부쳐진 장소에서 서식하고 있다. 왕벚나무 자생 기원지와 최고령의 연대를 증명하는 이 귀중한 나무에 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최고령 자생목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다가 내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람 가슴높이에서 둘레가 19피트나 되는 수령이 수백년된(270+/-60년) 최고령 왕벚나무를 필자가 확인하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自生地)에 천연기념물 제159호 지정된 수백년된 봉개동 토종 왕벚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과 전라도 대둔산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종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조직배양한 묘목이 제주 한라생태숲 조직배양실에서 배지에 담겨 자라고 있다. 왕벚나무 복제 묘목은 두 달 동안 배양한 후에 화분에 옮겨 심어 다시 두 달 동안 묘목이 순화(acclimatization)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비닐하우스에서 환경 적응을 하고 바깥에 옮겨져 총 5년 정도 자라면 유전적으로 제주 자생 왕벚나무와는 다른 종자인 벚꽃 고목나무 옆에 식재(植栽) 되어 세월이 가면 지금 있는 왕벚나무와 자연스럽게 가로수로 교체될 예정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복제 묘목이 제주 한라생태숲 연구실에서 순화(acclimatization) 중에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시의 유명한 전농로 벚꽃거리. 70살 이상 된 왕벚꽃나무들이 피운 벚꽃이 하늘을 가린다. 전농로 왕벚나무들은 한라산 자생종과 유전적으로 다른 품종으로, 우리 토종 왕벚나무 품종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시에서 유명한 전농로 벚꽃거리에 있는 70살 이상된 왕벚꽃나무가 벚꽃을 피운다. 전농로 왕벚나무는 우리 토종 왕벚나무 품종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한라산 자생종이 아닌 유전적으로 다른 품종의 벚꽃나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신산공원에 핀 왕벚꽃이 하늘을 가린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에 왕벚꽃과 유채꽃이 서로 어울려 보기 좋게 피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녹산로 왕벚꽃 길은 드라이브스루만 허용하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미국 워싱턴 DC의 유명한 벚꽃의 시작은 1912년에 동경시에서 선물한 3,020그루의 12종의 벚꽃나무로, 그중 1,800그루가 왕벚꽃 묘목이였다. 워싱턴 DC 왕벚꽃과 제주시에 있는 오래된 왕벚꽃은 물론 한국에 수없이 많이 있는 왕벚나무 꽃들은 제주 봉개동 토종 왕벚나무 꽃과 비교해보면 모양 자체가 다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신산공원에 핀 왕벚꽃은 꽃받침이 길고 컵 모양으로 생겼다. 제주에는 물론 한국에 수없이 많이 있는 왕벚나무 꽃은, 제주 봉개동 토종 왕벚나무 꽃과 비교해보면 모양 자체가 다르다.

제주 봉개동의 원조 토종 왕벚나무 꽃의 받침은 짧고 쐐기모양이다. 미국 워싱턴 DC의 왕벚꽃과 제주시에 있는 오래된 왕벚꽃은 꽃받침이 길고 컵 모양으로 생겼다.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自生地)에 천연기념물 제159호 지정된 수백년 된 봉개동 왕벚나무에서 피어나는 벚꽃은 꽃의 받침이 짧고 쐐기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잡종으로 자생하는 왕벚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한라산과 전라도 대둔산에만 있는 특산종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신산공원에 핀 왕벚꽃에서 직박구리 새가 꿀을 채취하고 있다. 제주시에 있는 오래된 왕벚꽃은 꽃받침이 길고 컵 모양으로 생겼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自生地)에서 동박새가 왕벚꽃 꿀을 채취하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 신산공원에 핀 왕벚꽃 밑으로 방문객들이 산책하고 있다. 제주는 물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왕벚나무는 우리 토종 왕벚나무 품종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유전적으로 다른 품종의 벚꽃나무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별도봉 오름 위로 벚꽃이 한창 피어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한라산 중턱에 높이 피어오르는 분홍색 벚꽃이 다른 나무들과 경쟁하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한라산 중턱에 하얀 벚꽃이 피어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2016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발견한 한국 최고령 왕벚나무로 추정되는 한라산 자생 특산종 왕벚나무가 보안상 비밀에 부쳐진 장소에서 서식하고 있다. 필자가 나무 크기와 둘레를 확인하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