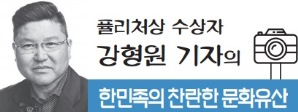▶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
▶ (39) 대금(大笒) 산조

코로나19 펜데믹 중에도 국립국악 원 풍류사랑방에서는 지난 4월14일 제 한된 관객 앞에서 어렵사리‘예술로 꿰 뚫다’ 일이관지(一以貫之) - 명인 시리 즈 공연이 열렸다. 이날 첫 공연자로 대금산조를 공연하는 원장현 명인. [Photo ⓒ 2021 Hyungwon Kang]

[Photo ⓒ 2021 Hyungwon Kang]

이날 명인 시리즈 첫 공연자로 공연하는 원장현 명인. 장구 반주는 김청만(오른쪽)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보유자가 맡았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기품 있는 한복을 입고 대금 산조를 연주하는 원장현 명인의 모습.
[Photo ⓒ 2021 Hyungwon Kang]

[Photo ⓒ 2021 Hyungwon Kang]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지난 4월14일 열린 공연은 관객수가 제한돼 앞의 두 줄은 비워놓고, 한 자리씩 떨어져서 관람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바닥이 온돌로 따뜻한 풍류사랑방에서는 관람객은 신발을 벗고 입장한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1979년 원장현 명인이 직접 대나 무로 제작해서 연주하고 있는 대금에 는 취구(吹口), 청공(淸孔), 여섯 개의 지공(指孔), 그리고 칠성공(七星孔)이 있다. 두 개의 칠성공은 음정을 미세 하게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대금의 독보적인 명인 원장현 연주가는 70세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수도자처럼 날마다 연습하고 있다. 대나무에는 보통 한쪽에 골이 파져있는데, 대금을 만드는 기형적으로 양쪽에 골이 패여 있는 강도가 높은 쌍골죽(쌍골 대나무)을 재료로 1979년에 직접 만든 대금을 가지고 본인의 후배 양성소 금현국악원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대금 연주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Photo ⓒ 2021 Hyungwon Kang]

[Photo ⓒ 2021 Hyungwon Kang]

원장현 명인이 운영하는 금현국악원에서 후배 양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Photo ⓒ 2021 Hyungwon Kang]
우리 민속음악에서 산조는 독주곡을 장구 반주와 곁들여 연주하는 음악인데, 대나무로 만든 악기 대금이야말로 인류의 어떤 다른 문명에서는 없는 음폭이 ‘넓고 큰’ 독특한 악기이다.
‘원장현류 대금산조’를 일찍이 35세에 소개한 현 시대의 민속음악인으로 대금의 독보적인 명인인 원장현은 “대금처럼 음역도 넓고 저음에서부터 높은 날카로운 소리까지 내는 악기는 이 세상에 없다”고 정의한다.
대금 연주를 듣다 보면 슬프고, 장쾌하며, 한편으로는 화려한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데, 대금 음악은 듣는 사람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대금은 악기 하나로 우리의 마음 깊은 감정 속의 슬픈 기억, 아득한 추억, 애절한 사랑, 한 맺힌 아픔이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끌어내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음악이다.
필자가 아는 캐나다의 치유 전문가는 대금 음악을 처음 듣고 바로 매료되어서 “이 훌륭한 음악을 환자들한테 들려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현대과학에서는 대금의 깊이 있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높이고, 태교 때 또는 명상을 하면서 듣는 다목적의 힐링 음악이 바로 대금산조다.
산조는 전라도 민속악인(民俗樂人)들이 주로 연주하던 곡으로, 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독주곡 형태의 하나인데,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배열된 3에서 6개의 장단 구성에 의한 악장으로 구분되며, 항상 장구 반주가 같이 따른다.
정확한 소리가 나는 서양악기 플루트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른 대금에서는, 음감이 없는 사람은 연주하기 어려운 음정이 있는데, 명인 연주가 집안답게 그의 손자인 초등학교 6학년생 원채우는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반 ‘구멍’ 음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능력을 보인다.
집안에서 가장 나이 어린 이 음악가는 본격적으로 대금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할아버지가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나무에는 보통 한쪽에 골이 파져있는데, 기형적으로 양쪽에 골이 패여 있는 강도가 높은 쌍골죽(쌍골 대나무)을 재료로 만드는 대금의 유래는 신라시대 문헌에 남아있다.
신라의 제31대 왕이며 신라시대 진골왕통의 세 번째 왕인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 은 통일을 이룩한 아버지 문무왕(文武王, 재위 661-681)의 뒤를 이어 그 당시 부상하는 일본, 통일신라 내부의 새로운 질서 등 어지러운 사회를 다스리는데, 강력한 통일신라의 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신물(神物)로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내놓는다.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불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 하여 이 피리를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고 불렀다. (줄여서 만파식적(萬波息笛)으로 널리 알려짐.)
대금을 연주하려면 호흡량과 폐활량이 건강해야 하는데, 중학교 이후 평생 대금을 불어온 원장현 대금 연주가는 3년 전에 135km 거리의 몽블랑 트레킹 등산을 6박8일 동안 다녀왔는데, 높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숨가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대금을 연주할 때는 호흡이 길어야 끊김이 없는 음을 부는데, 명인 원장현 연주가는 엄청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대금산조를 계속 완성해 가고 있다.
2021년 들어와서 본인이 세운 연습 목표로 첫 석 달 동안 40분 대금산조를 540회나 반복해서 연습했고, 6개월 동안 1,080회를 목표로 70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수도자처럼 날마다 연습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 강형원 기자의 우리·문화·역사 Visual History & Culture of Korea 전체 프로젝트 모음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ang.org/korea